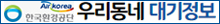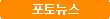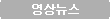"요즘 청년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아”, “살 곳이 없다 하고, 일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 “많이 배웠으면 뭐하나 창의적인 무엇하나 만들지 못하는데”
여전히 ‘청년’들에게 쏟아지는 ‘청년이 아닌 세대’들의 불평・불만들이다. 청년이슈와 정책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은 감출 수가 없다. 심지어 대안으로 제시된 청년 정책들이 ‘청년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외려 청년을 역차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인 사회를 꿈꿀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 유엔 해비타트 청년프로그램에서 자발적 청년들이 만드는 ‘국제 콘퍼런스’를 알게 됐다. 일정 중 11일 진행된 청년주거(SH공사 주관토론회)와 도시재생 관련 세션에 참가, 관심 있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편집자 주
“청년도 잘 살고 싶다”
여전히 청년은 소외돼 있다
“주거 관련 문제에 있어 이전에는 부모의 책임이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세대 노후 준비 등으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신혼부부・대학생 우선 제공으로 대부분 청년은 소외된 상황이다”
서울도시공사(SH) 변창흠 사장은 청년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이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위주의 주거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법・제도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청년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이슈인 도시재생 관련 변창흠 사장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자체・정치인・원주민 등 다양한 이해가 발생한다. 역세권 주택, 공공기관 복합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기존 거주민과 지역사회와의 공존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임대 주택 관련 지역 님비현상 등 부동산에 얽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곡지구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플랫폼’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곡산단에 주거와 창업+공동작업공간,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분리해 생각했던 3가지 부분을 인식의 전환으로 한 곳에 몰아 ‘청년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스타일의 주거, ‘저렴・쾌적’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청년이 원하는 주거공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과다공급보다는 저렴하고 쾌적한 거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이 사는 주거와는 다른(1인 가구)’, ‘편리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고(인프라)’, ‘이동시간 등 청년들의 시간이 고려될 수 있는(역세권)’, ‘현재 공급방식과 다른’ 형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 세대 간 주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거나, 청년 생활방식을 분석해 조건에 맞는 주거지역을 확보, 청년 주거공간을 좋은 상품화를 통해 지역에서 반길 수 있는(청년환대) 환경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문턱은 높고 선택지가 없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빌려 쓰더라도 괜찮은 사회’ 그리고 다양한 기회(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연결)를 보장하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며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